“고사리 있고 두부 있고 샐러드용 꽃상추 있고, 찌개랑 두부부침 상추무침.
내가 하겠다는 얘긴 아니고 먹고 싶다는 거지”
“아침은 뭐 먹지?” 하는 물음에 H씨 대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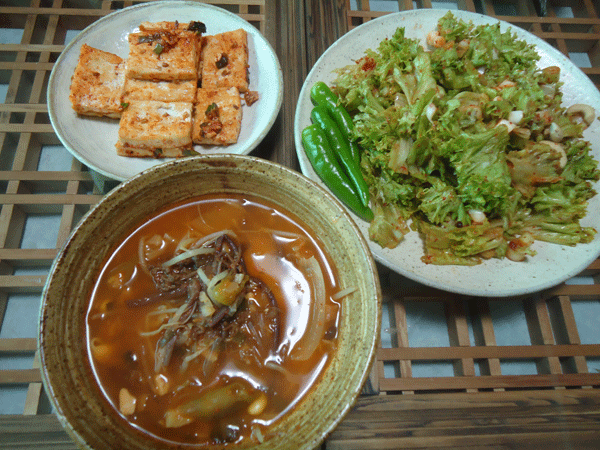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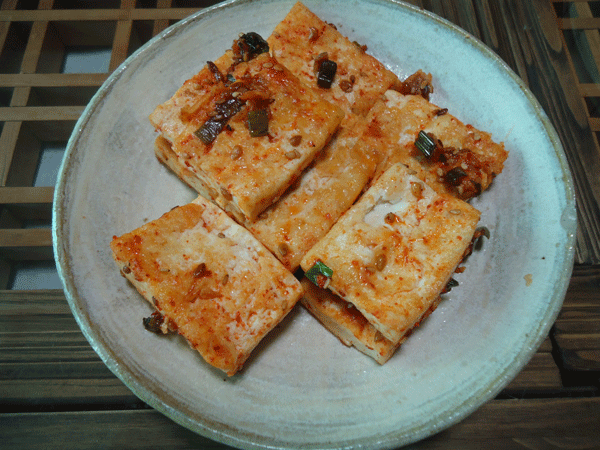
그래서 준비한 아침밥상입니다.
고사리, 콩나물, 양파, 감자까지 넣고 끓인 육개장 비슷한 찌개.
노릇하게 부친 두부를 양념간장에 따로 무쳐낸 두부부침.
상추 무침과 청양고추.
-----------------------------------------------------------------------------------------------
K에게
‘김예슬 선언’은 읽었니?
이제 시작이라 수업에 대해, 대학 생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르지?
김예슬 선언을 읽고 또 고등학교 때와 다르지 않은 수업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의미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지식의 광장이자 연구과정의 참가를 뜻하는 세미나가
학생 발표와 교수 독백의 형태를 띠며 ‘다 가공된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장소로 전락한 것과 더불어,
대학공부가 특권적인 직업을 보장하고 학업을 ‘경력 만들기’로 몰아가는 자격증 획득의 수단이 되었다.”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니. 1962년 독일의 한 대학연맹이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라는데,
‘68운동’(들녘, 정대성 옮김)이라는 책에 실린 건데
고미숙의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에로스’에서 재인용 되었더구나.(이 책 읽어볼래? 빌려줄까?)
그러니까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비슷하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유럽과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격차를 얘기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런 진단과 ‘김예슬 선언’같은 성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네가 하게 될 공부는 존재와 세상, 삶에 대한 사유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 자격증, 각종 시험 준비 사이의 시소게임이 될 거야.
20대 청춘의 고민과 삶에 대한 공부야 스스로 하는 거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고민 중 ‘먹고사는 문제’ ‘직업 문제’ 따위 고민을 좀 덜어주는 팁을 알려준다면,
‘사람은 왜 일을 해야 하는 걸까?’ 물어 보렴. ‘자아실현’ 이런 건 집어 치우고 스스로에게 물어 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야.
설사 돈이 있어도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아마 사람관계, 사회관계에서 찾아야 할 거야.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기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수단으로 ‘일’하는 건 아닐까.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수단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은 구체적으로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지.
지금 사회관계가 복잡하니 그 직업을 찾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와 교육에 닿으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 출발점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해답의 실마리는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수단으로서
‘일과 직업’을 ‘배려’라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용해보렴.
다른 사람, 관계에 대한 인정은 배려이기도 하거든.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위, 명예에 대한 욕구를 부정할 수 없지만
‘사회관계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자기로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그게 직업이란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면
‘사회관계에 대한 배려’로서 일과 직업을 이해 할 수 있을 거야.
말 나온 김에 관련해서 잔소리 좀 더 하자면,
학회 세미나나 봉사활동, 또는 다른 실천 활동, 알바 같은 걸 앞으로 하게 될 텐데.
뭐든 직접 몸으로 겪어보는 걸 주저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신이 걸은 만큼만 자신의 삶’이란 말이 있어.
‘쉬운 일’, ‘쉬운 과제’, ‘쉬운 활동’, ‘쉬운 돈벌이’를 벌써부터 찾는다면 청춘이 너무 빨리 가지 않을까?
알바를 하더라도 몸을 움직이며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해.
과외 같은 알바 보다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렴.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며 몸으로 익힌
‘사회관계’에 대한 배움이 ‘일과 직업’에 대한 고민의 답을 찾는데 가장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단다.
사람이 꼭 노동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을 통한 공부, 관계의 공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거라.
평생 삶에 대한 성찰만큼 관계에 대한 배려로서 ‘일’을 놓을 수 없단다.
오늘도 행복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