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과 자투리 야채가 있던 날.
작은 볼에 쓸어 담아 소금간하고 적당한 크기로 뭉쳐
버터 두른 후라이팬에 눌려 구웠다.
볶음밥의 모양 다른 버전쯤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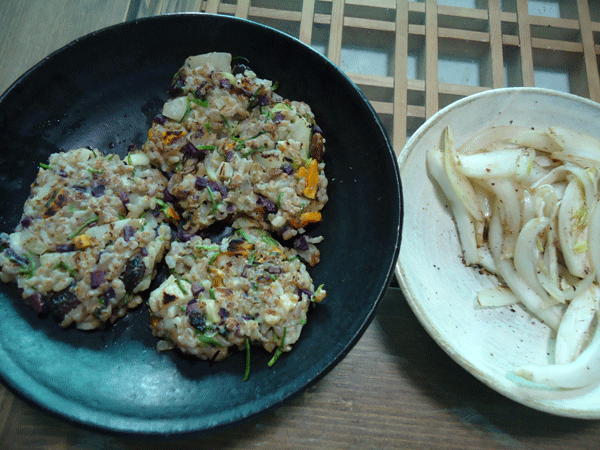
취향에 따라 케찹을 발라도 괜찮다.
밥전 만들고 열기 남아 있는 후라이팬에 양파 한번 휙~ 볶아주고 후추 뿌렸다.
밥전, 요즘 일요일 아점으로 먹는 메뉴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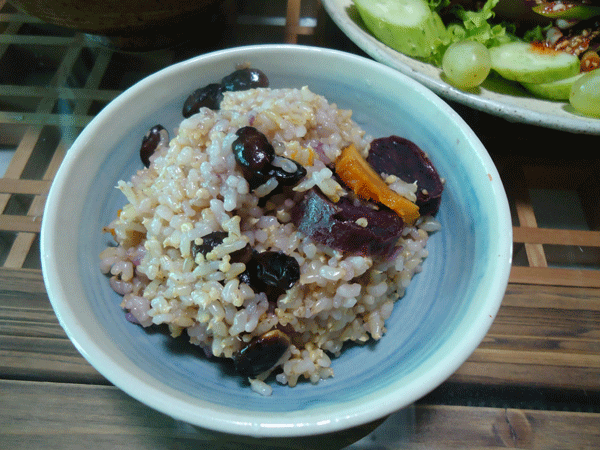

고사리, 도토리묵 무침, 이것저석 넣은 밥.
밤새 불린 고사리 볶고
묵은 심심하게 양념간장 뿌려서....
역시 자투리로 남은 오이 상추에 포도도 깔았다.
밥은 현미에 콩, 말린 호박, 자색고구마를 넣어 지었다.
단 맛이 없어 샐러드로나 어울리는 자색고구마가 쌀과 만나니 제법 단 맛이 났다.

김치가 없다며
후다닥 김치 썰어와
세식구 앉아.....
-------------------------------------------------------------------------------------
K에게
“못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짝을 이룰 때가 많다.”
못해서 싫은 건지, 싫어서 못하는 것인지 선후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취 없으면 흥미를 잃고 멀리하는 거야’ 당연지사다.
하지만 삶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잘하고 좋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싫어하고 못하는 것이 닥쳤을 때 주저앉아 낙담하거나 필할 수만도 없다. 삶은 늘 현재이고 선택이니까.
만일 지금 무언가 벽에 부딪쳐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다면,
주저앉아 있는 지금․그곳이 그의 삶이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건지 말지 선택도 그의 삶이되는 거란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대개는 스스로 만든다. 굽이굽이 펼쳐지는 삶이 어찌 좋을 수만 있겠니.
‘싫다.’ 찡그리고 멀리 하기 전에 한 번 그냥 꾹 참고 넘어보기도 하렴. 따라해 보기라도 하렴.
호불호가 분명한 네게 이런 말을 하는 게, ‘괜한 잔소리’이지 하면서도,
아직도 “00은 싫어!”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널 보면 좀 어려보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곤 한다.
‘해보긴 했니?’ ‘죽을힘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만 둘 수 있지만 싫어할 것까지는 없잖아.’
‘아는 것과 익숙해지는 것은 다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충분히 체화되기도 전에 배우는 것조차 포기하는 건 아닐까?’
딸!
“존재와 세상, 삶을 사유하고 스승을 찾아나서는 겸손과 열정이 가득해야 할 청춘,
20대에 지레 겁먹고 싫어할 게 뭐가 있겠니…….”
‘싫다’는 말, 찡그리기 전에 눈을 살짝 동그랗게 만들어 웃어보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본래 불확실한 게 삶이잖아. “까짓 것!” 크게 외치며 한번 웃어봐.
오늘도 행복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