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같이 먹을래요? 외식” 이라는 문자를 H씨한테 보냈었다.
‘어디서?’ 부터 몇 번의 문자가 오고갔으나 시간과 장소가 서로 안 맞아
‘그럼 각자 해결하고 집에서 봅시다.’ 라고 마지막 문자 보냈다.
하지만 H씨 ‘집 밥 먹고.싶다’ 다시 문자오고 나는 ‘귀찮아, 아무것도 없잖아’라는 대답으로 문자를 더 주고받았다.
결론은?
“냉장고에 찬밥 있어요. 8시 좀 넘으면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외식은 아까워서 다 먹어야 하고 부담스러워”라는 대답에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다.
7시 도착 대충 씻고 냉장고 뒤지니, 두 사람 분 조금 안 되는 찬밥과 곤드레 나물과 근대 삶은 게 있다.
아마도 냉동보관 했던 것 꺼내 놓았나본데 언제 꺼낸 건지는 모르겠다. 냄새 맡아봤지만 이상 없다.
그래도 혹시 몰라 찬물에 좀 담겨 몇 번 더 헹궜다. 일요일 텃밭에서 캐온 냉이도 다듬어진 상태로 한 움큼 있다.

밥솥에 참기름 좀 두르고 곤드레 나물 깔고 위에 찬밥 얹고 낮은 불에 올렸다.
밥이 조금 모자랄 때 양을 불리는데 나물만한 게 없다.
근대는 들기름과 참기름 반씩 섞어 다진 마늘 넣고 볶다가 실고추로 색을 약간 냈다. 간은 소금과 간장으로 했다.
퇴근길이 ‘춥다’ 싶을 만큼 바람도 많고 쌀쌀했다.
웬지 뜨거운 국물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시마 물에 김치 썰어 넣고 두부 넣고 김칫국도 앉혔다.

냉이는 데쳐 소금과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
그런데 좀 짜다.
곤드레나물밥 양념장으로 쓰려고 내놓은 달래 부랴부랴 다듬어 냉이와 함께 다시 조물조물.
이제 좀 먹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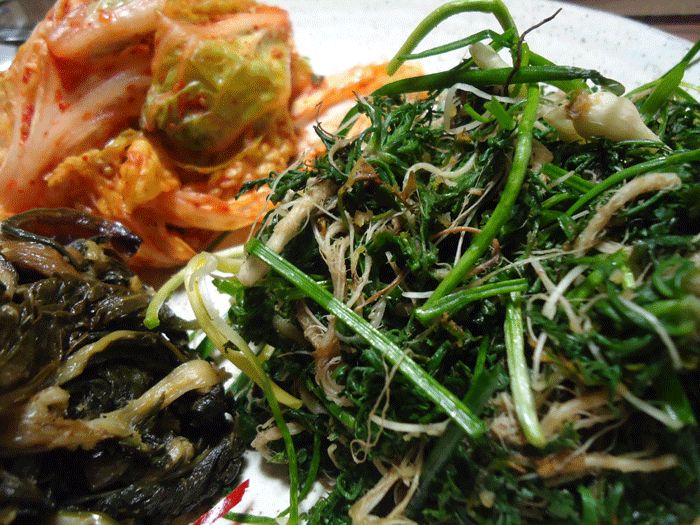

“세대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안내가 나오고 H씨 도착했다.
‘3월 들어, 주중에 밥을 안 하게 된다.’고 광고질?한 포스팅 후 벌어진 수요일 저녁 얘기다.


어찌되었든 한 시간쯤 동동거리며 준비해 싹싹 비울만큼 잘 먹은 저녁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H씨 “오늘은 몇 시에 와요?” 묻기에 “별일 없는데…….” 대답했더니
“나 보다 일찍 오겠네, 퇴근했을 때 집이 일주일 전 모습으로 치워져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말 남기고 표표히 사라지더라.
‘꼼짝하기 싫은데…….’
‘저녁에 가볍게 한 잔?’ 하며 이곳저곳 비루하게 문자라도 보내 볼까?
아니면 곱게 집에 기어들어갈까, 조신하게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저녁이나 준비해놓을까?
손뼉을 쳐본다. 정신이 번쩍 들어 세세한 일상에 충실해지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