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늦은 오후,
“무슨, 사위 오는 것도 아니고…….” 두부 부치며, 더덕 구우며 좀 투덜거렸습니다.

기숙사 들어가고 9일 만에 집에 오는 K 먹으라고 ‘인절미를 하고 더덕사야 한다.’며 아침부터 수선스럽게 할 때 사실 살짝 삐졌습니다. ‘아니 다 큰 딸 기숙사서 집에 오는 게 군대 간 아들 첫 휴가 나오는 듯 해’ 하면서 속으로 좀 궁시렁댔습니다.
결국 더덕도 사다가 까고 방망이로 두들겨 펴고 간장양념에 재 놓고 아침부터 불린 찹쌀은 찜기에 쪄서 양푼에 넣고 한참을 실랑이하며 빻고 도마위에 콩고물 펴고 적당한 크기로 빻은 밥을 펴서 콩고물 무쳐 또 썰고. 인절미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떡집서 인절미 한 팩 사다주지” 하는 말 안한 거 아닙니다. “집에 콩고물도 있는데 뭐 하러 사요. 적당히 밥알 뭉개지게 집에서 한 게 더 맛있어”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 아무튼! 2시쯤 출발한다는 녀석이 친구만나 잠깐 놀고 온다기에 그러라 했고 출발한다는 전화 또 왔기에 시간 맞춰 찰밥하고 두부 부치고 더덕 구웠습니다. 냉이 된장국도 끓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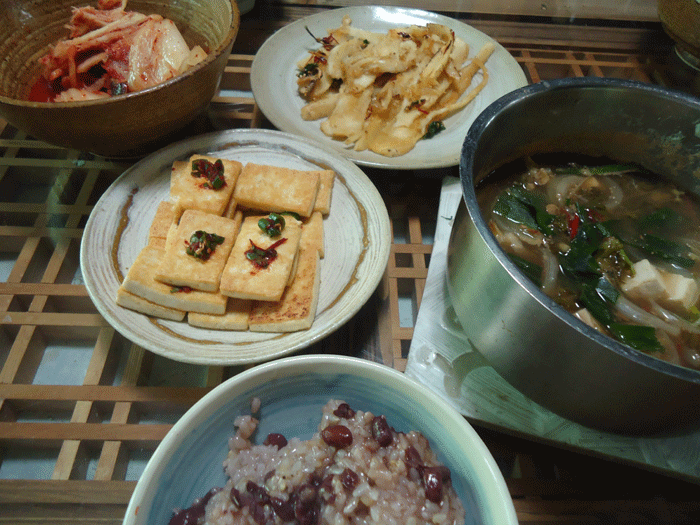
기분엔 하루 종일 준비한 것 같은데 차려 놓고 보니 또 그저 그런 밥상입니다. 게다가 냉이 된장국은 욕 나올 뻔했습니다. 냉이에 뭔가 잘못 들어간 건지, 몹시 썼습니다. 씀바귀 씹는 맛이었습니다. 두부랑 건더기 몇 점 집어 먹는 걸로 끝내고 버렸습니다. 처음 당하는 냉이 굴욕이었습니다. OTL
K가 저거 잘 먹었냐고요. 입으론 “음, 맛있어”를 연발했지만 밥은 반쯤 먹고 더덕도 매운 것 싫어해서 간장양념으로 해줬더니, “난 고추장 양념이 더 좋은데” 하며 그냥 저냥. 그나마 두부는 열심히 먹더군요. 후식으로 인절미도 두어 개 먹고 ‘배부르다’ 며 끝.

지난 토요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봄, 말처럼 따뜻했고 바람도 봄바람이었습니다. 이른 저녁식사 후, 기분 좋은 봄바람 맞으며 세 식구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 맥주 샀습니다. ‘감기 걸린 애한테 술은?’ 하며 질겁하는 H씨는 뒤로 하고 K와 한잔했습니다. K가 함께 해준 맥주 때문에 살짝 삐졌던 건 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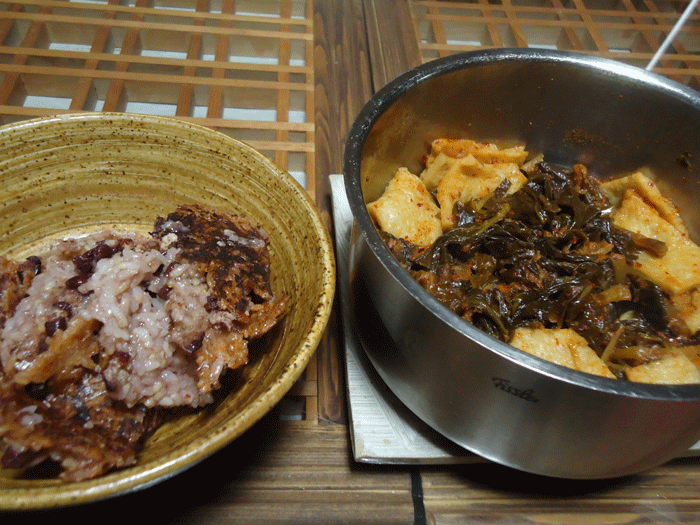
학회 있다며 일요일 오후 K가 학교로 돌아간 후, 정작 나는 남은 찰밥을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 이틀이나 더 먹었다. K가 부러운 주말이었다. “딸! 넌 좋겠다. 엄마 있어서, 떡 해주는 엄마…….”
비온다네요.
아직 비온다고 삭신 쑤실 나이도 아닌데 오늘 왜 이리 몸도 맘도 축축 쳐지는지....
꿀꿀해지지 말자고 맘이라도 떠나보자고 눈이라도 멀리 보자고
안구 정화용 사진 몇장 양념으로 곁들입니다.




박은옥 정태춘의 사랑하는 이에게입니다. 오늘같은 날 딱인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날은 흐려도 오늘 삶은 화창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