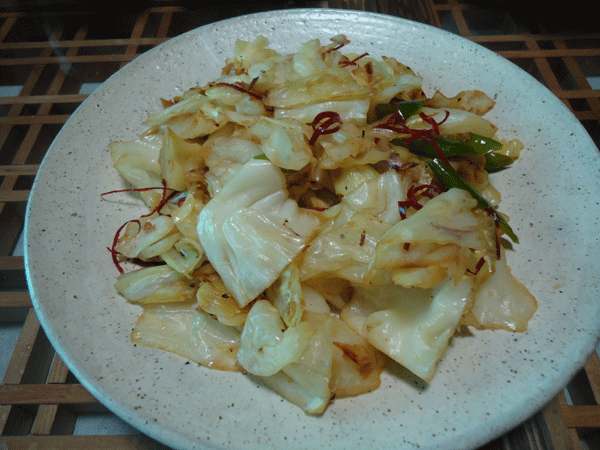
양배추 볶음, 들기름에 청고추와 붉은 실고추 넣고 소금 간으로 센불에 볶았다.
냉장고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오래된 반 토막 양배추가 주빈으로 오른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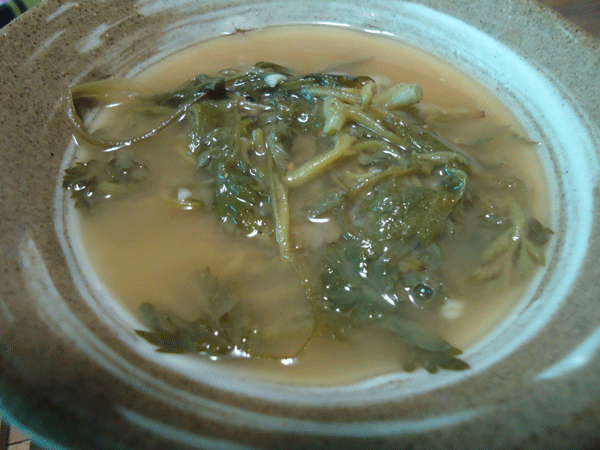
쑥국, 뭐니 뭐니 해도 봄 하면 쑥이다. 된장에 들깨가루 풀어 끓였다.

돌나물 무침,
간장 식초 적당히 넣고 들기름 살짝 두르고
고춧가루 슬금슬금 뿌려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미나리와 버섯 무침,
미나리도 버섯도 양이 작아 함께 무쳐 한 그릇 겨우 만들었다.
미나리는 데쳐 물기 짜고 버섯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꼭 짜내,
소금 간하고 다진 마늘 조금 넣고 참기름에 조물조물.
실고추도 한꼬집 정도 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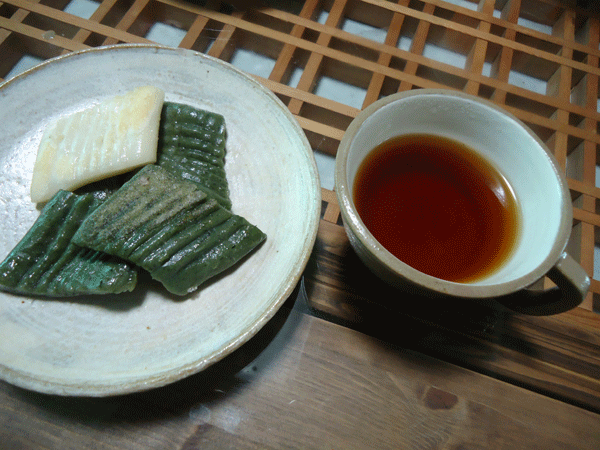
정말 아무 것도 해 먹기 싫던 어느 날,
냉장고 속 절편 참기름 두른 팬에 구워 커피와.

무조림, 항아리 속 겹겹이 싸여 베란다서 겨울을 나고 싹을 올리던 무.
달달 부드러운 맛의 극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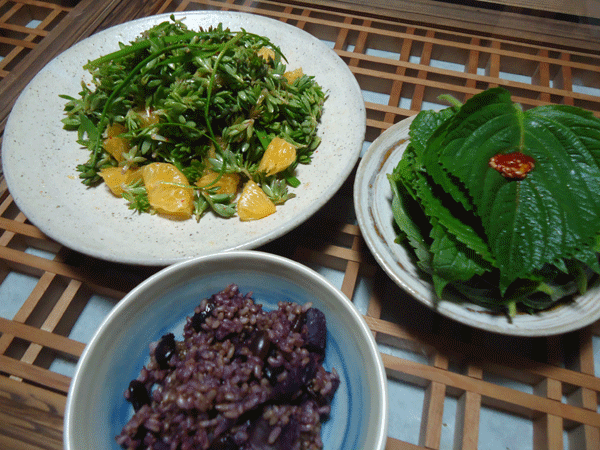
양념장 얹은 깻잎과 돌나물 샐러드?
텃밭서 새싹을 올린 돌나물과 역시 새로 돋아난 부추와 팔삭.
팔삭은 제주도 토종과일이라는데,
귤도 오렌지도 한라봉도 아니고 모양은 비슷하나
자몽 맛도 나는 아주 오묘한 과일이다.
칼로 겉껍질을 깎고 속껍질도 일일이 벗겨 먹어야 하는 수고가 없었다면
‘이게 뭔 맛이래?’ 씁쓸 달달한 표정으로 한 없이 먹을 지도 모르는 중독성 강한.
-----------------------------------------------------------------------------------------------
#!
학기 초 ‘죽음’에 관한 과제가 있는데 ‘어렵다’며 물어오는 K에게,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의 문제 때문일 거야.”
“죽음 자체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한 달 전쯤,
중간고사 시험 대신 과학, 종교, 문학, 철학에서의 죽음에 대해,
하나를 선택해 열 장짜리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며, ‘뭐가 좋겠냐?’고 묻는 K에게.
‘종교, 특히 불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역시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라’며 얘기했던 적이 있다.
H씨에게도 물었던 모양인데 H씨는 ‘문학에서의 죽음’을 권했던 모양이다.
역시 숙제는 숙제인건지. 한 달여 동안 뭘 했는지…….
지난 금요일 밤 뜬금없이 “불교 책 없어, 책 좀 추천해줘.” 한다.
“왜? 아직 안 했어. 이제 책 봐서 되겠냐?”
“엄마말대로 소설 책 하나 잡아서 읽고 써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독후감 쓰듯이…….”라고 했더니.
“화요일까지 내야하는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기에.
‘허접한 꽃들의 축제’와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소疏, 금강경 별기)를 읽어보라고 했다.
“ ‘허접한 꽃들의 축제’ 중에 스티브잡스 얘기 나오는데, 거기부터 읽어봐.”
“ ‘붓다의 치명적 농담’이 1권인데 아마 1권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걸…….”이라며.
토, 일요일 내내 도서관가고 책 빌려 보는 것 같아, 그러려니 하고 있었다.
화요일, 어제 아침, 노동절이라 나는 집에 있고 아침에 학교 가는 K에게,
“과제는 다 했냐?” 물었더니.
“쓰긴 썼는데 인용한 게 많아 인용이랑 각주를 백만 개는 달아야 할 거 같아.”
“이따가 집에 와서 마저 써서 내면 돼.”라고 한다.
“오늘 내는 거 아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응, 밤 12시까지 온라인으로.”라고 한다.(세상 참! 숙제도 온라인으로 내고^^*)
“얼마나 베꼈기에 주석을 백만 개나 다냐? 니 생각을 써야지.”
“헤헤 내 생각은 없어요…….” 하며 돌아서 나가는 K 뒤통수에 대고
“다 쓰고 나면 한번 보여줘!” 했더니. “보여주긴 뭘 보여줘!” 하며 쌩 나가더라.
#2
“인생은 두 단계를 거친다. 반항과 설교…….”
“저울이 보람보다 신세 쪽으로 기운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K덕분에 ‘허접한 꽃들이 축제’를 다시 집어 들고 뒤적이다가 본 문장이다.
앞뒤 맥락은 다 던져버리고 이 두 문장에 꽂혀 버렸다.
‘나는 지금 어디 만큼 있나. 반항인가? 설교인가?’
‘반항과 설교라는 두 단계는 아마도 젊다는 것과 나이 듦을 말하는 걸 텐데…….’
‘물리적 나이 이전에 삶을 대하는 태도, 욕구를 말하는 거겠지…….’ 하는 혼잣말은.
‘반항……. 충분히 반항은 했던가? 김예슬의 물음처럼 충분히 래디컬 했나?’
‘저항하는 삶이 아름답다던 지표는 젊은 날의 추억쯤이 돼버린 걸까’
‘어설픈 저항과 경험으로 조로 해버린 건 아닐까?’
‘20대의 저항조차 혹 어설픈 설교는 아니었을까? 저항이라 착각한 건 아니었나?’
‘보람과 신세, 내 삶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어느새 물음이 돼 돌아왔다.
늘 삶은 현재기에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 다짐하건만,
여전히 오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고 지나온 것들에 매달려 의미 부여하는 나를 본다.
아직은 설교 따위 할 때가 아닌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