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기다리던 베를린 필하모니 12 첼리스트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워낙 첼로를 좋아하는지라 12명의 앙상블에 행복했지만 워낙 소품인 곡만 연주해서 그런지
마치 본방송은 놓치고 후속 이야기만 듣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파티의 주메뉴는 못 먹고
맛있는 디저트만 이것 저것 골라먹고 혀는 기뻐하지만 배속은 조금 더부룩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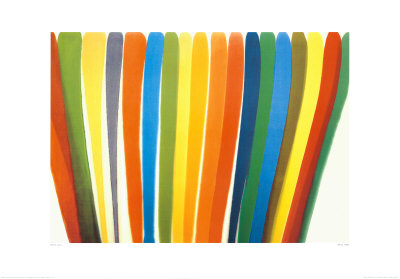
몇년 동안 예술의 전당에 다녔지만 그렇게 로비가 뜨겁다는 느낌이 든 것은 오랫만이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사람들의 수도 사람들의 느낌도 뭔가 다른 기분이었다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공연장에서도 마치 월드컵 응원온 사람들같은 그런 격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연주 후의 after도 풍성했습니다.

후반부의 곡들은 차렷 자세로 앉아서 듣기 보다는 와인잔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들으면 더 좋거나
아니면 함께 어울려 몸을 움직이면서 들으면 더 행복할 곡들이 여러 곡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그리운 금강산을 편곡해서 들려주자 여기 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하던 순간이 기억나네요.

음악회의 꽃은 -협연이 아무리 좋다해도-역시 교향곡이라고 생각하는 제겐 그래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교향곡을 듣는 것은 너무 무거운 느낌이라서 어제 구한 보로딘 쿼텟의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를 듣는데 소리보다 자꾸 그들의 손동작에 신경이 쓰여서 (이제 막 시작한
바이올린때문에 생긴 이상한 증세라고 할까요 ? ) 영상을 멀리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골라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리포사님 집에서 러시안 레전드란 제목의 음반을 빌리기 시작한 이래로 압도적으오
러시아 출신 작곡가, 혹은 연주자의 곡들을 듣고 있는 셈이로군요. 이렇게 러시아는 제게 음악으로 다가와서
이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군요.



 회원정보가 없습니다
회원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