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강의하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벌써 6번째,반이 휘리릭 넘어가는 날
오늘은 말레비치,칸딘스키,그리고 몬드리안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화가가 두 명이나 끼어있다보니
다른 날보다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지요.
광화문에서 내려서 가을날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아침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다바르님이겠지요?
반갑게 인사하고 강의실에 들어가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들고간 아이세움의 고흐책을 건네주고
저도 반이정의 새빨간 미술의 고백을 빌렸습니다.
읽어야 할 책과 읽고 싶은 책중에서 역시 힘이 센 것은
읽고 싶은 책이더군요.
사실 오늘 현대미술 그 중에서도 추상회화에 대한 수업이니
다시 읽어보아야지 하고 꺼낸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대여점에서 빌린 김탁환의 열하광인을 앞에 두니
도저히 시선을 뗄 수 없어서
다시 정조시대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요
반이정의 글도 사실은 이번 강의의 후반기 강좌와 어울리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제목이 벌써 매력적인 책이라
아마 읽고 싶은 책의 대열에 바로 끼게 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드는군요.
오늘 강의의 시작은 말레비치가 아니라
오히려 미술의 시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작에 관한 이야기까지 정리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겠지요?
제게 인상적인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플라톤의 철인국가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시인과
예술가의 지위가
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격상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를 간략하면서도
요점을 파악하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아하,그래서 플로티누스가
메디치 가문의 아카데미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로군
하고 드디어 아하 하는 소리가 절로 나는 시간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계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현실계의 불완전성을 모방한
그림의 세계,이렇게 이데아에서 두 단계 떨어진
모방의 세계를 다룬 예술을 저급한 단계로 보았지요.
그러나 플로티누스의 경우
가장 위에 존재하는 일자로부터 흘러넘친 기운이
그 아래 단계로 들어와서 영향을 준다고 보았는데
가장 아래 단계가 바로 물질계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이 물질계가 예술에서는 질료가 되는 것인데
르네상스 시대에 고전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피렌체에서 연구되면서
플라톤 아카데미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그 곳에서 신플라톤주의의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의 경우 물질인 대리석을 보고
그 안에 잠들어있는 영상을 파악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조각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우
물질계가 단지 물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각가는 물질에 정신,영혼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는
셈이라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예술가도 물질을 갖고 대상을 창조하는 존재로
격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 경우 작품과 작가를 놓고 살펴보면
작품을 통해 작가를 거꾸로 이해하게 되고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다룰 화가들의 경우에는 작품과 작가가 서로 다른
존재를 주장한다는 관점이 참 신선했습니다.
그렇구나,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도
현대와 그 이전을 가르는 선을 보여주네 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지요.

말레비치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니
러시아 입체파 화가로 분류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가 미술사에서 중요한 것은 입체파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주의란 표현으로 알려진
한 유파의 기수가 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der Suprematism I understand the supremacy of pure feeling in creative art. To the Suprematist the visual phenomena of the objective world are, in themselves, meaningless; the significant thing is feeling, as such, quite apart from the environment in which it is called forth.


절대주의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의 뿌리를 보여주는 것
그 과정에서 화가의 감정을 순수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세잔에게 원을 비롯한 기하학적 구성이 중요했듯이
말레비치에게 마지막까지 벗겨서 남은 것이
원,사각형등이었다고 하네요.
언뜻 보면 도대체 화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들이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원화앞에서 보면 검정이 단지 검정에 불과할 것인가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입체파에서 검정 서클과 검정 사각형으로
그 다음 일차대전이 발발한 1914년의 그림은 다시
앞의 경향으로 선회를 하더군요.

제게 익숙한 말레비치는 여기서부터로군요.


말레비치는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절대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네요.
그의 이런 생각이 개념미술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고요.
이제 캔버스는 캔버스밖의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캔버스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힘으로 캔버스를 주시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의 이런 이미지들은 칸딘스키의 후기 작품들이
절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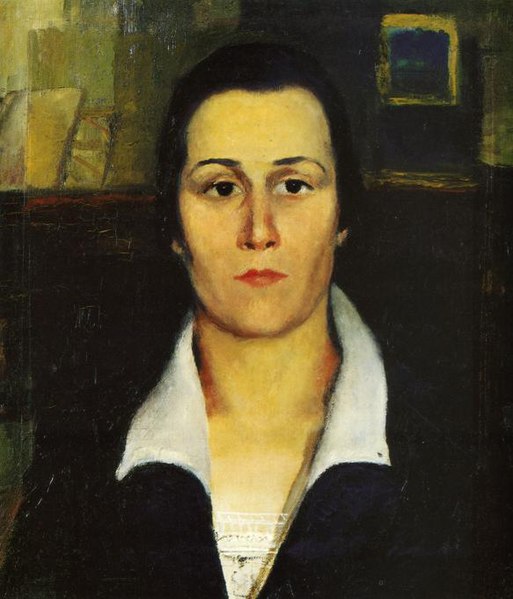
그림을 찾다보니 다양한 그림들이 아주 많군요.
어디서 어떻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나,그 과정을 조금 더 알고 싶어지네요.
말레비치의 그림에서 발이 묶여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은 내일이나 모레
시간 여유가 있는 날,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정보가 없습니다
회원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