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올려두 되나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많은 분들이 보셔도 될 듯하여 옮겨봅니다.
지인의 지인쯤 되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그 분은 현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잘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목련화는 지는데"
제1부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
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과 내가 갈아엎어야 할
저 많은 묵정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논두렁을 덮는 망촛대와 잡풀가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았다 일어섭니다
<도종환 "접시꽃 당신">
--------------------------------------------------------------------------------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좋은 날엔
그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조관우 "꽃밭에서">
1997년 뜨거운 여름, 죽은 아내를 황토 빛 땅에 묻고, 근처 개울에서 세수를 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는 밥과 나물을 꾹꾹 씹어서 목구멍에 집어 넣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내 뺨 위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세수를 하고, 또 밥과 나물을 입에 쑤셔 넣었다.
3일 후, 나는 관악산에 올랐다. 큰 돌을 집어 들어 바위에 힘껏 내쳤다. 돌이 바위에 부딪쳐 불꽃이 튀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목이 떨어져 나가라고 아내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다.
그 뒤 나를 많이 울게도 하고, 우는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노래가 조관우의 "꽃밭에서"이고,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이었다. 차를 타고 "꽃밭에서"를 들으면 눈물이 흘러 내렸고, "접시꽃 당신"을 읽으면 책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다.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낸지 11년이 넘었다. 세월처럼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 터질 것 같은 가슴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도, 울부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규도, 이제는 저 멀리 추억이라는 먼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려고 한다.
나는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지난 날의 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통증을 다시 느끼고 싶지도 않았고, 그 상처를 다시 돋보기로 들여다 보며, 슬픔을 반추(反芻)하고 싶지도 않았다. 옛 상처와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냥 조용히 지내려 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지 않으면 과거의 모든 기억과 추억이 완전히 내 뇌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쁜 기억도 나의 일 부분이요, 슬픈 기억도 나의 일 부분일 것이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또 감출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과거의 쓰라림이 거의 다 아물고, 기억이 조금 남아 있는 지금이, 그때를 기록하는 최고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나 땅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을 하나하나 주어 담는 심정으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할 생각이다. 11년전 기억을 찾아서, 그 당시의 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사실을 담담하게 펼칠 것이다.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 글 쓰는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만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끝맺음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붓이 가는 데까지 갔다가 멈추면, 그냥 멈출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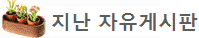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목련화는 지는데 (8-1 펌)
... 조회수 : 324
작성일 : 2009-01-08 01:56:30
IP : 121.134.xxx.2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