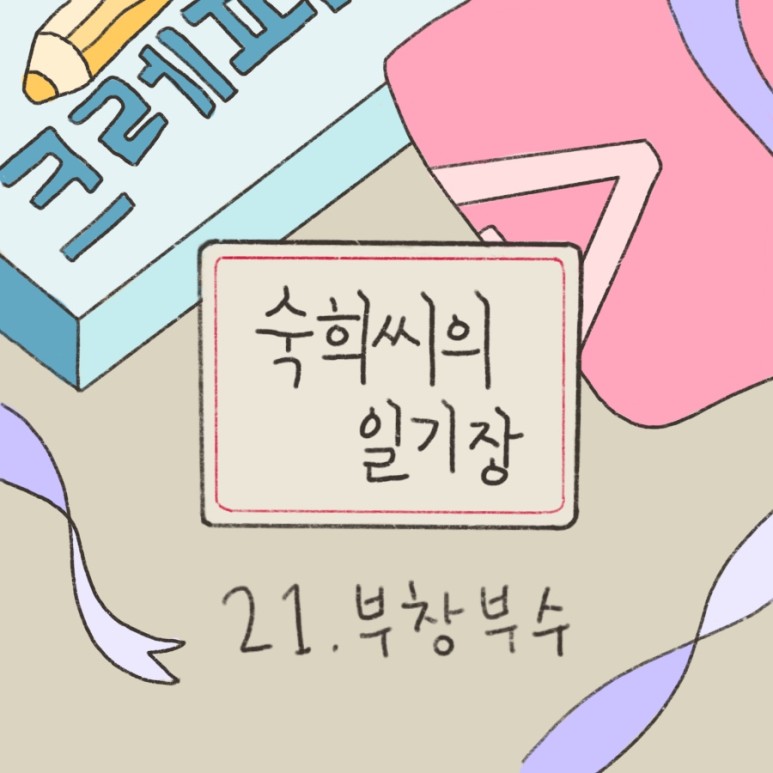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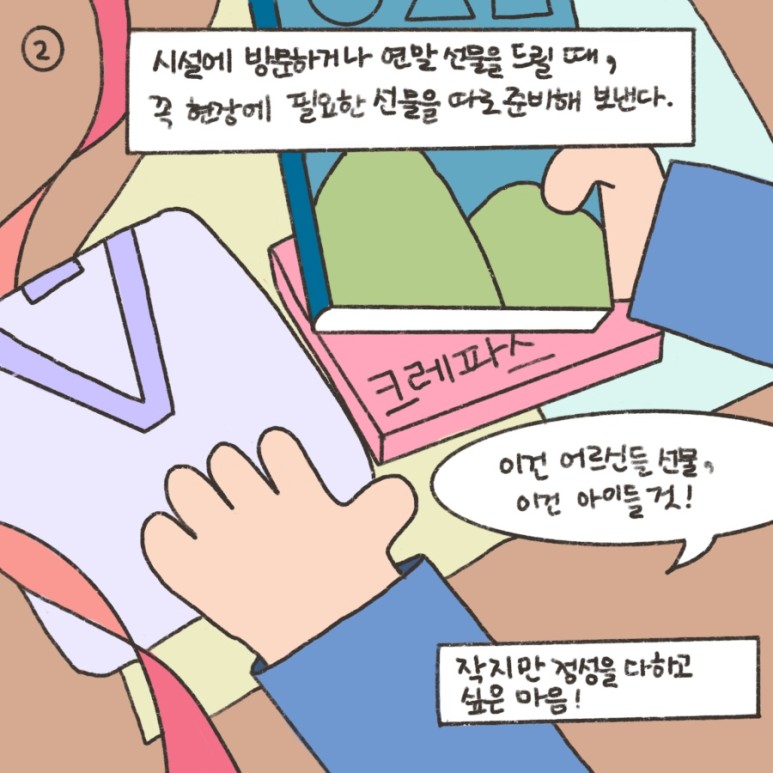




정치하는 남편 옆에서 힘들지만 그만큼 배운 게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장을 잘 살피고, 지역의 주민 처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은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수첩을 들고 항상 현장을 다녔습니다.
저도 현장을 수시로 다니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분들 말씀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으로 노력했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 방문을 할 때 선물을 드리잖아요.
보통은 같은 물건을 일괄적으로 사서 보냅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여쭙고 그걸 준비하려 했어요.
작지만 정성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또 남편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재능이 남달라요.
몇 년 전 만났던 사람을 만나도 바로 기억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지 하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죠.
오랜 세월 남편과 같이했지만 볼 때마다 저도 놀라워요.
저도 될 수 있는 한 상대방의 이름을 외워서 이름으로 불러드리려 해요.
이름을 부르면 한결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였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또한 서로가 오랜 세월 이름을 불러주고 얼굴을 마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닮아가고 삶의 박자를 맞춰가네요.
그야말로 부창부수로 살고 있습니다.
[출처] 숙희씨의 일기 #21 부창부수|작성자 여니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