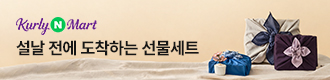저는, 차가 없는 뚜벅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버스를 애용해요,
아카시아향기가 코끝을 벌름대게 하는 온화한 봄날이나, 선선한 가을날에는
버스정류장의 의자에 앉아 잠시 기다리는 건 어쩌면, 좋은일일수 있어요.
가끔 푸른 코발트빛 하늘, 금방이라도 물이 뚝뚝 흐를듯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투명한 햇빛이 정류장 지붕끝에 매달려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건 모든 아날로그들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해볼수있는 몇가지 일들일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아날로그적인 낭만도 허락이 되지않을때는
요즘같은 폭염이에요.
목을 빼도 기다려도, 와야 할 버스가 더 늦어서 오지않고,
뚜벅이 엄마덕분에 같이 리틀뚜벅이인 7세아들은,
땀이 범벅되어서 벌겋게 익은 시장에서 파는 도너츠같은 얼굴로
울어요.
버스가 안온다고~
들고 온 양산으로 일단 머리위를 가려주지만, 어림없어요.
그런 우리애 얼굴을 보니까..
'아들, 앞으로 조금 더살다보면, 이렇게 애간장 녹는 일이 많단다.
특히 아들이 누굴 만나 사랑하든지 그게 이런 더디오는 버스같은 여자라면
그 속은 더 까맣게 탈거야~'
측은해지는거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뜨거운 폭염을 뚫고 우리가 타야할 버스가 오고
그 안에 앉아 창밖을 보면, 세상 너무 시원해요.
그전의 슬픔은 금새 잊어버리고, 밝아져서, 방송멘트를 따라하기도 하고
이젠 다 외워버려서 즐거워해요.
"엄마, 아깐 너무 더웠지?"
"응, 바깥은 여름~"
"버스안은 서늘한 가을."
"바람의 살들이 푸른 청보리밭을 일렁거리게 하기를."
"엄마의 살들이 옷자락보다 넉넉하지 않기를."
우리들의 대화는 가끔, 이렇게 무심히 버스안에서 ,혹은 길위에서
시작되었다가 사라지곤 해요.
2099년엔 엄마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던데,
아들, 그런 질문은 너무 슬픈거야,,,
그런 장난스런 질문도 괜히 슬퍼지게 하는 아들,
넌 운좋으면 어쩌면 살아있을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건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