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젯밤일이다. H씨 퇴근이 늦었다.
9시 뉴스 보고 있는데, ‘세대차량이 도착했습니다.’는 인터폰의 알림이 들렸다.
잠시 후, 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에 현관 앞에 섰다. 두 팔 활짝 벌리고 빙그레 웃으며.
“어서 와요. 수고했어요.” H씨를 맞았다.
현관 들어서며 켜진 불과 함께 내 모습을 본 H씨.
“피터 팬 같아, 아저씨 피터 팬” 하며 웃기에 살짝 안으며,
“왠 피터 팬?” 하니.
“좋네, 그렇게 활짝 웃어주는 게. 환한 게 피터 팬 같았어.” 하며 날 꼭 안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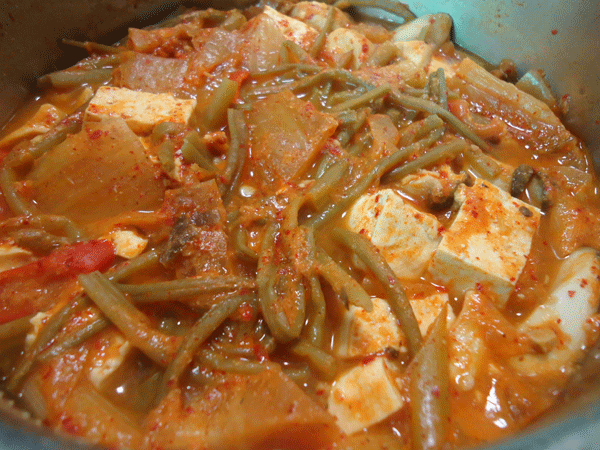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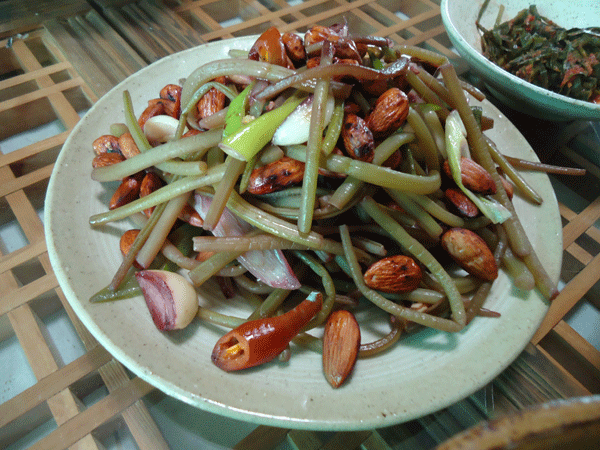
<요즘 자주 해먹는 고구마줄기 음식들>
고추장 풀어 고구마 줄기 지짐을 하려다가 먹다 남은 김치 꼭 짜서 넣고 함께 찌개로 끊였다.
고구마줄기 볶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두르고 통마늘과 껍질 벗겨 데쳐놓은 고구마 줄기 넣고 볶는다.
마늘향이 퍼질 때쯤 대추,양파, 아몬드 같은 것 더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했다.
세 번째 사진은 마지막에 복분자효소를 넣어 색과 단맛을 더한 거다.
맛은? 심심한 듯 식감도 다르고 고구마순은 사실 별 맛없었다. 하지만 중독성 있는 뭣처럼 계속해서 손이 간다.
#2
H씨 출근이 나보다 30여분 빠르다.
그래서 출근 준비로 바쁜 H씨와 달리 나는 30여분 더 단잠에 빠져 있는 편이다. 오늘 아침도 그랬다.
침대서 뒹굴 거리며 가물가물 게으름 피우다가 H씨 인기척에,
“운전 조심해요, 나 한 번 안아주고 가지?”라고 했더니. H씨 누워있는 내게와 한 번 토닥이더니,
“게으른 아저씨 같으니라고. 그래서 안 늙나봐. 늙는 것도 부지런해야하는데. 게으른 피터팬!”하며 나갔다.
시적순간이다. 아니 시적순간인 것 같았다.
그런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까무룩 하던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
‘뭐야! 어제부터 피터팬 얘기하더니 결국은 게으르고 철없다는 거였어.’하는 생각에 후다닥 일어났다.
덕분에 시간이 좀 있어 집 좀 치우고나오려다가 그냥 출근했다. 소심한 복수로.


<무청과 묵은 총각김치 된장 지짐>
무청 겉잎 뜯어다가 우거지로 지졌다.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작년 총각김치가 아직 한통이나 남아있다.
적당히 물에 씻어 된장 풀고 우거지처럼 지졌다. 갓 뜯어온 무청우거지와는 다른 맛이 있다.
-----------------------------------------------------------------------------------------------
K에게
세상을 보는 (괄호)에 대한 답은 찾았니?
감기 기운 있다던데, 좀 어때?
주말까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 옷 든든히 챙겨라.
‘나는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물음의 끝에
‘그럼 세상은 날 뭐로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덧붙였다가 부질없는 것 같아 그만 두었다.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날 뭐로 보고 취급하든, 결국 내 삶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내겐 꿈이 있다.
나이 들수록 근사한 사람이 되자는. 근사한 삶이지. 담담하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 삶에 도달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이기적, 개인적, 제한적 생각들이 불러오는 어리석음을 놓아 버린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내 것, 나 아닌 타자의 고통 앞에서 내 이해관계를 따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나(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것.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때?’ 하는 생각들로 ‘배려’를 잊은 행동들.
시간이든 공간이든 스스로 제한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도 제약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이고 현재라는 시공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까닭이 아닌지 묻는 것으로
나의 (괄호)를 채워보아야겠다.
K야
부디 너의 (괄호)를 채우는 일을 미루지 말거라. 치열하게 채워보길 바란다.
오늘도 행복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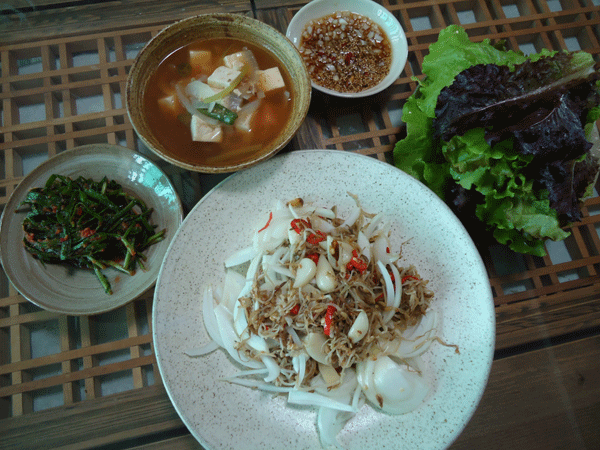
<마지막 가을 상추 따다 부추김치와 두부찌개.
냉장고 구석에서 색이 바래가고 있던 숙주와 양파, 마늘볶음을 곤드레밥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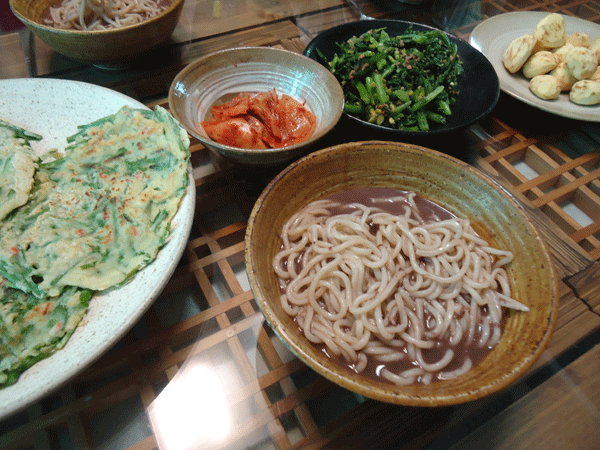
<K가 왔던 시월 초, 팥 칼국수와 깻잎 전>

<베란다서 얌전히 곶감이 되고 있는 청도반시,
희한하게 내가 맛보면 떫은데 H씨 맛 본건 단맛이 제법 들어 곶감이 되고 있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