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느 토요일 저녁
뜬금없이 맥주 생각이 났다.
집 앞 상가로 맥주 사러가는 길
내 또래쯤의 중년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 집에 들러 주문부터 했다.
검은 비닐봉지에 서너 종류의 캔 맥주와 막걸리 담아
털래털래 다시 치킨집으로.
십여 분 기다리는 동안,
“혼자라 양이 많아 그러는데 반 마리는 안파세요?” 물으니
“왜 혼자 드세요? 어디 가셨어요?” 한다.
“아~ 예……. 안 먹어서요?”
“튀긴 거 싫어하시나 부네” 혼잣말처럼 아줌마 말씀하시자
“애기 때문일 수도 있지” 절임 무 포장하던 아저씨 거드신다.
바로 “아~ 임신 중이시구나!” 하는 아줌마 말씀에
나? 할 말을 잃고 그저 웃었다. 빙그레~~~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다.

밥하며 함께 찐 고구마와 고사리
한 여름 풋고추 따다 담가둔 고추장아찌 무침과
고추와 죽순을 넣고 담갔던 죽순장아찌
#2
근래 부쩍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
현관 신발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발 정리는 내 몫이 됐다.
집을 나고 들며 보게 되는
가지런히 짝 맞춰 놓인 신발이 상큼함을 동반한다.
신발만큼은 아니지만 쌓여 있으면 심란한 게 재활용 쓰레기다.
그러다보니 분리배출 자주 하게 된다.
며칠 전 분리배출 하는 길에 음식쓰레기까지 들고 나갔다.
자동집하기에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분리배출 하러 돌아서는데
분리배출 마친 덩치 큰 젊은 남자 하나
음식물 담긴 투명비닐 들고 마주 걸어온다.
‘설마 저걸 그냥 버리진 않겠지?’ 했는데,
당당히 음식쓰레기 집하기에 태그를 대더라.
순간, ‘이 봐요! 음식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지.’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으나 하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봉변당하지 않을까?’ ‘괜한 오지랖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듯하다.
흐트러진 것들을 거슬려 하면서 어떤 것들은 애써 외면하는,
선택적 정렬과 비겁 사이에 있는 나를 자주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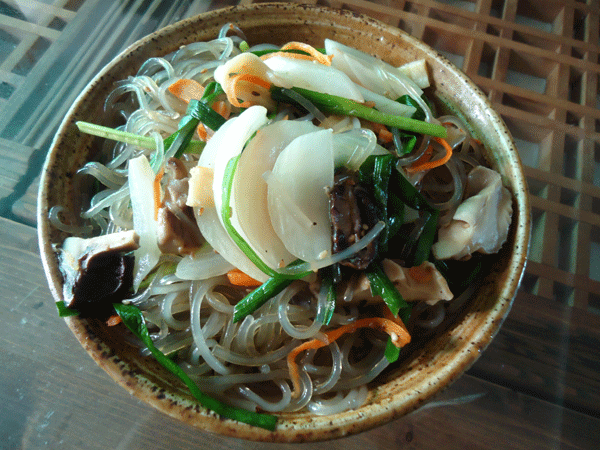
부추, 버섯, 양파를 잔뜩 넣고
고기 한 점 없이 당면 맛으로 먹는 잡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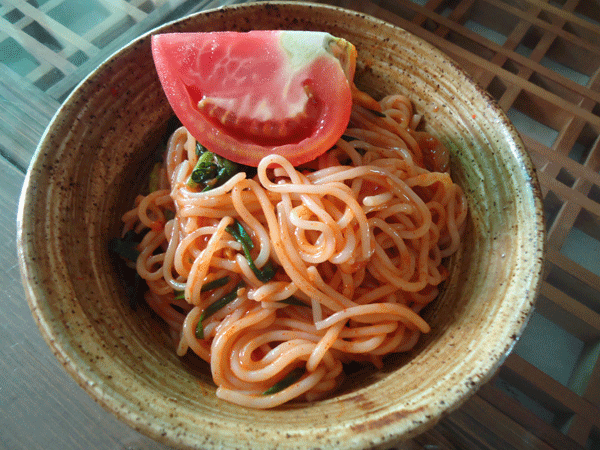
먹다 남은 부추김치만 넣고 비빈 국수
왠지 허전해 토마토 한쪽 커다랗게 올렸다.
#3
오랜만에 세 식구 저녁 먹고 TV보는데
H씨 “나도 오빠 있으면 좋겠다.” 한다.
동생들 끔찍이 생각하는 내용의 드라마를 보고 있었기에,
“없는 오빠를 어쩌겠어.” 심상히 대꾸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내가 00씨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 진지하게 묻는다.
순간 K와 나 “푸하하~” 정말 뿜고 말았다.
아무래도 우리에겐 형제애가 필요한 것 같다.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 일상들이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의 상차림처럼.
작물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가을볕에 이러고 산다.

고춧잎 따다가 살짝 데쳐 고추장과 유자청에 무쳤다.

따로 삶아서 된장에 무친 고구마 줄기

부추볶음, 들기름 살짝 두른 팬에 홍고추 썰어 넣고 휘리릭 볶아
소금으로 간하고 깨를 뿌렸다.

갓 지은 현미밥을 고추장만으로 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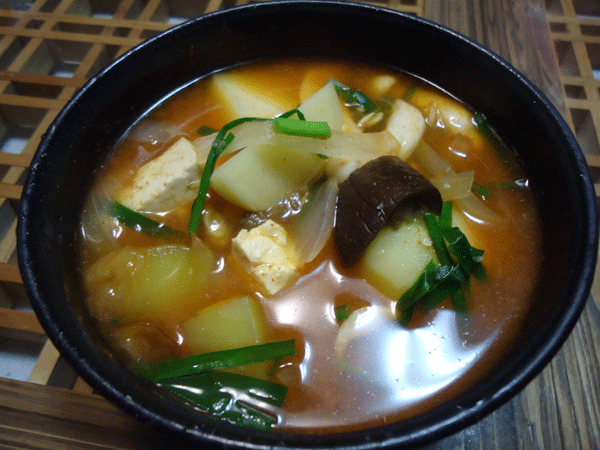
두부, 양파, 부추를 넣은 심심한 고추장 감잣국
국만 먹어도 배부르다.
딱 이렇게 한 그릇씩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