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참 게으른 인간이라는 걸.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글 쓰는 일조차 극히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다시 말해 먹고 살 생계비가 있는 한은) 잡문 청탁은 거부합니다. 소설 쓰기만도 벅차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시국에 무슨 헛소리냐고요? 제가 미쳐서 그렇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글을 원고료 한푼 안 받고 어딘가 투고하겠다고. 어디서도 안 받아주면 내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인쇄하고 복사해서 거리에 나가 뿌리겠다고. 게으른 내가, 이 게으른 내가 말입니다.
진정성이란 말이 조롱의 대상이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대담론이 공격받고 미세담론이 득세하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정신적 타래의 핵심은, 중간중간 얇아지긴 했으나 그 후 쭉 면면하게 이어져온 동아줄 파토스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명분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 매우 옳게 들렸습니다. 역시 개인은 막강했고 계급은 개급이 되었습니다. 개급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렵니다. 개인이 속한 급수이니 그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할 것이며,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개 같아도 얼마나 절대적인 급이겠습니까. 그 미세구분은, 거대구분에 사로잡혀 있던 제게 참으로 현실적이고 수긍이 가는 논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진정성이라는 개념,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고자 분투하는 비개인적인 헌신적 욕망으로 일컬어지는 산소같은 개념을 내다버렸습니다. 개념이 없어지자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음껏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진정성이란 틀에 죄수처럼 사로잡혀 울며 불던 소녀시절을 조롱적으로 애도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왔을까요? 포퓰리즘의 핵이며 연기의 달인이자 최고의 승부사라 일컬어진 노무현은 얼마나 비진정한 주제에 진정성을 연기한다고 생각되어 왔는지요? 그런데도 저는 왜 그렇게 노무현이 좋았을까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그랬습니다. 종종 주변의 노리갯감이 되곤 했던 저의 노무현 애호증은 그 당시 제게 깊은 반성을 불러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소녀시절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서 더 두텁고 강하게 무장해야 한다고. 뭘로? 냉소주의로. 소쿨주의로. 탈정치주의로. 그리하여 드디어 제 심장에 굳은살처럼 박힌 저 깊은 지적 냉소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도 놀라울 만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도 놀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부디 좀 잘했으면’ 하는 우려에 찬 기대까지 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노무현이 없는 오늘,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더라도 제 속에 있던 이 세련된 냉소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 굳은살이 퍼져있는 한 제 심장은 이미 굳어 있고 제 피는 이미 찹니다.
제가 이 알량한 개같은 개급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고민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의 시절을 마감하지 않으면 저의 생도 마감될 것 같은 위기를 느낍니다.
바낭이지만, 저는 이제껏 함께 술을 먹으며 얘기하기를 원하는가 아닌가의 잣대로 정치인을 구분해왔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제가 마주앉아 대작할 권리를 준 유일한 정치인은 노무현뿐이었습니다. 늦게나마 허공에 잔을 들어 노무현과 건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주정합니다.
“정말 이 놈의 국민노릇이란 거, 못해먹겠다는 위기의식이 드네요”.
(노무현, 내게 그러지 말라고 토닥토닥.)
역시 바낭이지만, 저에게는 각각의 대통령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떠오르는 아주 감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이라는 이름에서는 죽이고 싶다는 살의를, 김영삼이란 이름에서는 마구 꼬집어주고 싶다는 얄미움을 느낍니다. 임기 일 년을 넘긴 현직 대통령의 이름에서는, 일단 제 손바닥에 침을 뱉은 후 그 밋밋한 쥐통수를 있는 힘껏 갈겨버리고 싶은 혐오와 가증을 느낍니다. 참고로, 한 대 맞고 정신 차릴 것 같지는 않기에 이 갈김은 빛의 속도로 몇(십) 차례 반복된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자신에게 말하렵니다. 당신에게가 아닙니다.
나, 노무현의 뜨거운 피를 조롱해왔던 저 냉혈의 피를, 제대로 불살라버릴 만큼 다시 한번 격노할 의지가 있는가. 한번도 노무현보다 더 뜨거워본 적이 없다고 진정으로 참회해 볼 용기가 있는가. 이 감상적으로 철철 하강하는 눈물을, 실천하는 근육으로 느릿느릿 고통스럽게 바꾸어갈 인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울면서 노무현을 보낼 권리가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저의 생애 내내 끝없이 떠오를 전대미문의 정직한 질문인 노무현의 Q 앞에서, 나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취한 몸 낮게 엎드려 중얼대고 또 중얼대며 웁니다.
‘전 대통령’에서 ‘전’ 자를 뗍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내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만큼 바꾸어놓았으니,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모든 진정성을 담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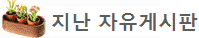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전자 조회수 : 105
작성일 : 2009-05-29 02:27:56
IP : 121.134.xxx.17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