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24.일요일
88년이었을 게다. 그 날은 아침부터 재수, 삼수생 몇명과 모여 학원 대신 종일 당구를 치고 있었다. 그 시절 그 또래가 5공의 의미를 제대로 알 리 없었다. 게다가 일주일치 식대를 걸고 내기당구까지 치고 있었으니 당구장에서 틀어놓은 5공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는, 다이 위의 하꾸 각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멈춘 공 앞에 서고 보니 하필 TV와 정면이었고, 그 순간 화면엔 웬 새마을운동 읍네 청년지부장 같이 생긴 남자 하나가 떠 있었다. 무심하게 허리를 숙이는데, 익숙한 얼굴이 언뜻 스쳐갔다. 고개를 다시 들었다.
정주영이었다.
그 남자는 몰라도 정주영이 얼마나 거물인지는 그 나이에도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 촌뜨기가 그런 거물을 상대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다. 타임을 외치고 TV 앞으로 달려갔다.
일해재단 성금의 강제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줬다 답함으로써 스스로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군사정권의 일방적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공손히 '회장님' 대접을 받고 있던 정주영을, 그 촌뜨기만은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촌뜨기 :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회장 : ...
촌뜨기 : 그것은 단순히 현상유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정회장 :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괴로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영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촌뜨기 : 혹시 그 순응이, 부정한 것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회장 :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촌뜨기 : 일해가 막후 권부라는 것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이전에는 묵묵히 추종하다가, 그 권력이 퇴조하니까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회장 : ...
촌뜨기 : 왜 부정이 아니라면 진작부터 6.29 이전부터 바른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정회장 : 우리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촌뜨기 :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고 없을 때에는 권력과 멀리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게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회장 : ...
당구 치다 말고 TV 앞에 모여든 놈들 입에서 탄성이 흘러 나왔다.
"와, 말 잘 한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순식간에 끌렸던 건 그의 논리와 달변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모든 의원들이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서 스스로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을 때, 그만은 정면으로 그 권력을 상대하고 있었다. 참으로 씩씩한 남자였다. 그건 논리 이전의 문제였다. 그건 가르치거나 흉내로 될 일이 아니었다. 난 그렇게 노무현을 처음 만났다.
그 날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많은 일들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되짚는 일은 그만 두련다. 한참이나 기억을 늘어놓다 다 지워버렸다. 그건 다른 이들이 잘 할 테니까. 그 사이 뭘 잘 했고 뭘 못 했는지 하는 이야기도 그만 두련다. 그 역시 다른 이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은 그저 2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를 오늘 이렇게 보내고 마는 내 개인적인 심정만 이야기 하련다.
난 그를 두 번 직접 만났다. 부산에서 또 다시 낙선한 직후인 2000년 3월이 처음이었다. 그에게서 반드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를 한 번은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정말 그렇게 씩씩한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은 차일피일 게재를 미루다 그냥 덮고 말았다. 어차피 만남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인 2001년, 해수부 장관 시절 그를 다시 한 번 만났다. 그때 이야기는 2002년 대선의 잠재후보군을 연쇄 인터뷰하던 시리즈의 하나로 지면에 실었다. 당시만 해도 그를 유력후보라 부르는 건 사실상 억지였으나 그리고 대통령에 실제 당선될 확률은 거의 제로라 여겼으나, 그것과 무관하게 그의 인터뷰를 꼭 싣고 싶었다.
그렇게 두 번의 만남에서 오갔던 말들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건 하나 밖에 없다. 그는 진짜로, 씩씩한 남자였다는 거. 그가 대통령으로 내린 판단 중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결정들도 많았으나 언제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그래서였다. 정치고 뭐고 다 떠나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씩씩한 남자였다. 스스로에게 당당했고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상대했다. 난 그를 정치인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의 남자로서 진심으로 좋아했다.
그런데 그가 투신을 했단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죽음이 갑작스러워서는 아니다. 사람의 이별이란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따지고 보면 그와의 첫 만남도 아무런 예고 따윈 없었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그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의 방식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돌아올 줄 알았다. 최근의 뉴스에 별반 관심이 없었던 것도 그래서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난 그를 완전하고 흠결 없는 정치인으로 좋아했던 게 아니었기에. 뭐가 어찌 되었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 여겼다. 그는 내게 그만한 남자였다.
그런 그가 투신을 했단다. 투신이라니. 가장 시답잖은 자들에게 가장 씩씩한 남자가 당하고 말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억울하건만 투신이라니. 그것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죽음이 아니라 그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루 종일 뉴스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 투신 직전 담배 한 개비를 찾았다는 대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씩씩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에 담배 한 개비를 찾았단다.
울컥했다.
에이 ㅆ바... 왜 담배가 하필 그 순간에 없었어. 담배가 왜 없었냐고. 에이 ㅆ바...
그거는 피고 갔어야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옆에서 담배 한 개비 건네줬어야 하는 건데.
그가 그렇게 가는 걸 말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담배 한 개비는 피우고 가게 해줬어야 하는 건데.
노무현은 그 정도 자격 있는 남잔데. 그 씩씩한 남자를 그렇게 마지막 예도 갖춰주지 못하고
보내버렸다는 게, 그게 너무 속이 상해 눈물이 난다.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정권에 대한 성토도 지금은 다 싫다.
지금은 그저 담배 한 개비를 그에게 물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못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할 뿐이다...
그 담배 한 개비는 피고 갔어야 했는데...
그게 속이 상해 자꾸 눈물이 난다...
나머지는 다음에,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두 번째 만남에서 너무 촌뜨기처럼 담배 핀다고
묻어 뒀던 사진 한 장, 이제 그의 곁으로 보낸다.
딴지총수(oujoo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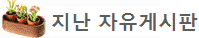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근조] 내가 반했던 남자........펌>>>>
홍이 조회수 : 296
작성일 : 2009-05-24 23:18:45
IP : 115.140.xxx.1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