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한 마리 받을 사람 찾습니다 / 손철주
삶의창
» 손철주 학고재 주간
내가 일하는 학고재에서 기획전이 열린 통에 구경 나온 친지들 치다꺼리하느라 보름 넘게 발품과 입심을 팔았다. 구한말을 지나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세월 동안 제작된 우리 그림과 글씨 일백여 점이 나온 전시였다. 반딧불과 성냥불이 더불어 밤을 밝히던 저 아스라한 근대의 추억이 출품작마다 서렸다. 다들 사연 많은 작품인지라 아는 관객들은 그림 뒷얘기 한 토막이라도 더 듣고자 내 소매를 잡아끌었다. 전시가 끝난 뒤 몇 분이 전화해서 소감을 말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대원군 난초와 김옥균 글씨의 뜻이 좋다지만 나는 ‘게 그림’이 가장 맘에 들어.”
내가 게 그림 앞에서 유독 잡설을 늘어놓긴 했다. 하여도 알토란 같은 작품 밀치고 게를 보며 반색한 분들의 심사는 알 듯 모를 듯하다. 전시에는 두 화가의 게 그림이 나왔다. 양기훈과 지창한, 둘 다 이북 출신 작가다. 재미있다면, 이들이 게를 그린 뒤 붙인 글이 똑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 물론 한문이다. ‘껍질이 딱딱하고 집게는 뾰족해서/ 온 바다를 옆걸음 치며 가네.’ 옛 화가가 게를 그릴 때 작심하는 뜻은 흔히 ‘과거급제’다. 등딱지(甲)에서 ‘장원’을 떠올려 보라는 수작이다. 두 작가의 속내도 어금지금한데, 그들은 제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거기에 게의 딴 이름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곧 ‘무장공자’(無腸公子)와 ‘횡행개사’(橫行介士)다. 게의 본성에서 따온 이 별칭은 내력이 기발하다.
먼저 ‘무장공자’를 보자. 남도 사투리로 할작시면 ‘창시 없는 아그’다. 딱딱한 껍질은 갑옷이요 뾰족한 집게는 창에 비유되니, 겉보기는 용맹한 무사와 빼닮았는데 막상 속을 까보면 창자가 없다. 배알 빠진 떠꺼머리 꼴이다. 창자가 빠지면 영판 실없는 꼬락서니가 될까. 천만에, 외려 남부러운 장점이 생긴다. ‘창자가 끊어지는 설움’을 모른다는 것. 미물에게 그나마 ‘공자’라는 점잖은 신분을 안겨준 연유다. 게 그림을 그린 두 화가와 같은 시대를 산 학자 윤희구는 그래서 ‘공자는 창자가 없으니 진정 부럽구려/ 평생 단장의 아픔을 모를 터이니’라고 읊었다. 정초에 이별수를 뽑은 관객이라면 게 그림이 부러웠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횡행개사’는 ‘기개 있는 옆걸음질의 무사’란 뜻이다. 김시습은 <금오신화>에서 게를 ‘곽(郭)개사’라 부르는데, 이 역시 걷는 모양에서 따온 지칭이다. 또 단원 김홍도는 게 그림에 ‘용왕 앞에서도 옆걸음 치네’라고 써넣었다. 게는 게걸음을 할 뿐인데 사람 눈에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하는 존재처럼 보였나 보다. 게는 강골의 이단아가 됐다. 이런 이미지는 문예를 넘어 정치에 등장하는 것을 나는 지난해 영양 서석지에 가서 알았다. 서석지는 광해군의 서슬을 피해 영양에 은거하던 석문 정영방이 조성한 연못이다. 석문의 주손이 건네준 자료를 뒤적이다가 나는 예화 하나를 찾았다. 석문은 우복 정경세의 제자로 둘 다 퇴계의 학통을 이었다. 인조반정 뒤에 판서를 지내던 우복이 석문을 조정에 천거했다. 이에 석문이 우복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낸다. 편지에 ‘화합하지 못하니 벼슬에 머물지 못합니다’라고 씌어 있었다. 우복이 선물 꾸러미를 풀었더니 바다 게 한 마리가 나왔다. 우복은 얼른 알아차렸다. “비켜 걷는 생물을 보냈구나. 나마저 정치에서 물러나란 뜻이군.”
사연이 얄궂어서일까, 시절이 하수상한 탓일까. 게 그림이 맘에 와 닿은 까닭이 있을 터인데 속없이 사는 게 나은지 시속을 거스르는 게 옳은지, 나는 모른다. 다만, 게 한 마리 보낼 사람을 찾고 있다.
손철주 학고재 주간
출처:한겨레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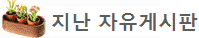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게 한 마리 받을 사람 찾습니다
리치코바 조회수 : 766
작성일 : 2009-01-31 10:31:19
IP : 118.32.xxx.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