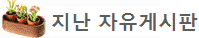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토닥토닥 자장가 소리
깜장이 집사 조회수 : 216
작성일 : 2008-11-28 09:59:48
아기는 태어나 어미와 함께 그곳에 간다.
일하는 어미 곁에서 토닥토닥 소리 들으며 잠이 들고, 품에 안겨 젖을 먹는다.
어미의 자장가는 한낮의 채석장 돌 깨는 소리, 그 토닥 소리를 닮아간다.
아장 아장 걷기 시작한다. 어미 곁에서 잠들던 아이는 놀이를 찾는다.
고사리 손에 딱일 돌을 어미 앞 바구니에 주워 담는다.
어느새 어미의 망치를 탐낸다.
아비는 능숙한 솜씨로 고사리 손에 어울리는 망치를 선물한다.
그곳에서 아기는 그렇게 어미와 함께했다.
어느 날이다. 세상은 그 아비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동 노동착취.
아비에게 이야기한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정말로 아니라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먼 한국땅의 노래가 들려온다.
젊음 아버지는 새벽에 일 나가고
어머니도 돈 벌러 파출부 나가고
지하실 단칸방에 어린 우리 둘이서
아침 햇살 드는 높은 창문 아래 앉아
방문은 밖으로 자물쇠 잠겨 있고 윗목에는 싸늘한 밥상과 요강이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우린 심심해도 할 게 없었네
낮엔 테레비도 안 하고 우린 켤 줄도 몰라
밤에 보는 테레비도 남의 나라 세상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나와 우리 집도 우리 동네도 안 나와
조그만 창문의 햇볕도 스러지고 우린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다 깨다 꿈인지도 모르게 또 성냥불 장난을 했었어
정태춘 곡 <우리들의 죽음>에서
*1989년 맞벌이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하러 나간 사이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어린 두 영혼을 위한 노래다.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인권]이라는 잡지를 보는데 이번 내용에는 위의 내용이 있더군요.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날은 점점 추워지고 세상은 몇십년전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고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어제 지하철에서 가방을 뒤적여 저 잡지를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혼났었습니다. 그냥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어요.
저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가까운 아니면 조금은 먼 누군가가 생각나기도 했었고 추위에 떨며 찬밥 한덩이씩 떼어먹을 등이 시린 부모들의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벌써 겨울인가 봅니다. 제 마음은 벌써 시려오네요.
한 겨울에 양말도 신지 않은 어린시절 누군가의 빨개진 발등이 자꾸 제 코끝을 시리게 만드네요.
인구 천만이 산다는 서울의 한켠에서도 그렇겠지요. 누군가는 주린 배를 움켜지고 가난을 허하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겠지요.
추수가 끝난 논밭을 보면서 뿌듯함보다 두려움이 뿌리내린다는 어느 농부의 떨군 고개가 떠오릅니다.
마음의 월동준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냥 씁니다. 정말 그냥요.
사실 요즘 살림하기 퍽퍽합니다. 시장가기 겁납니다.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안납니다.
제 가난만 보이고 제 추위만 보이는 것 같아서 어젠 많이 미안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만 수백번 먹었던 봉사활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IP : 61.25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8.11.28 10:10 AM (117.20.xxx.27)마음이.....너무 안 좋아요.
저도 살림살이 너무 너무 팍팍한데...저 역시 장 보러 안 나간지
4일이 됐네요..돈 아낄려구요..
근데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많은
현실인거 같습니다.
우리 위보단 모두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
한번 더 생각해봐요...2. 뷰티
'08.11.28 10:22 AM (58.142.xxx.21)점,점 차가워지는 요즘,어딘가에서 추위에 떨며.
배고픔을 참는 사람들..알게 모르게 많이들 계실꺼예요...
정 말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주위사람들 ,한번씩 둘러보는 ,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졸겠어요..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가사만 봐도 마음이 아프네요..3. 뷰티
'08.11.28 10:23 AM (58.142.xxx.21)위글중 오타 ,졸겠어요,,좋겠어요 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