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전, 아들이 축구하러 가는 날이라고 일찍 깨워 달라고 하네요.
덕분에 저도 일찍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고는 꼭 해야 할 공부를 끝냈습니다. 독일어로 읽는 베토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읽는 책중에서 비행기의 발전에 관한 영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도 문맥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고민해야 하는 표현들과 씨름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할 만한 음악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고른 곡이 드보르작
마침 뉴욕 필이 평양에서 공연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아침에 세계사 연표를 정리하다가 동부 유럽의 지도를 유심히 보면서 아, 여기가 바로 슬로바키아로구나
그렇다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거기서 독일, 이런 식으로 유럽을 찬찬히 볼 수 있는 날이 오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 바탕에는
슬로바키아에 가서 살게 된 러블리걸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한 나라였다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외에는 거의 아는 것이 없던 상태에서 그 한 번의 대화로
이렇게 지도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 참 재미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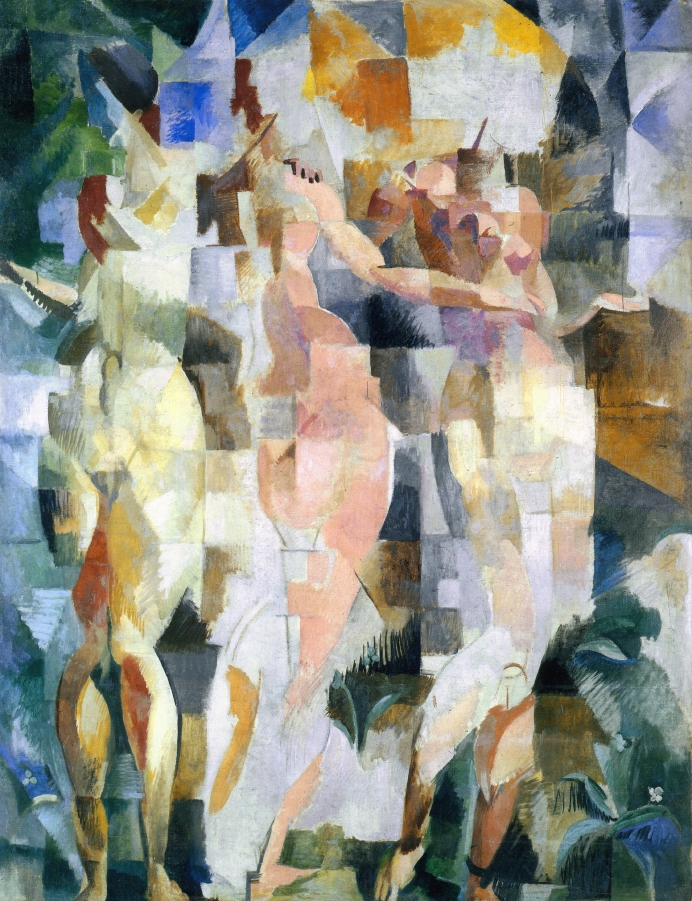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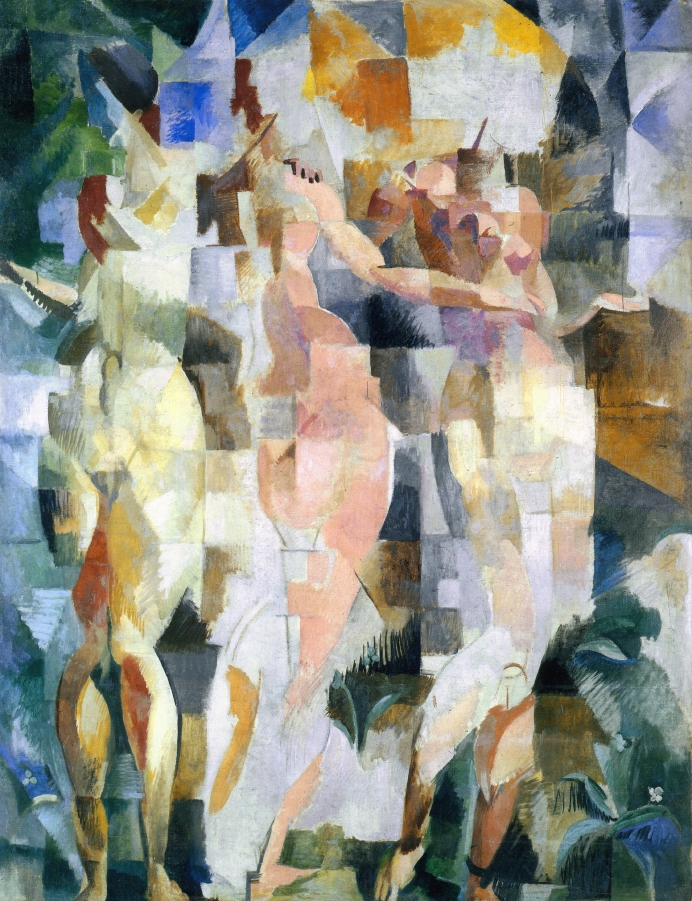
열무김치님이 키프로스에 간 이후로 책에서 만나는 키프로스가 단순히 지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것도
재미있게 느끼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물이나 지역, 혹은 사람에 대해서 혹은 화가나 작가에 대해서 갖는 그런
미묘한 관심의 시작은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제 그리스인 이야기2권을 읽다가 결국은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을 주문하러 서점에 갔습니다.
대학원 첫 학기에 그리스 비극 수업을 들었을 때만 해도 다시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소포클레스의 작품과 진지하게
만나게 될 일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그 때만 해도 어려서 그리스 비극의 세계가 제겐 너무 버거웠지요.
너무나 강렬하고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도 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과연 일상에서도 가능한가 그런 의문을 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 다시 만나는 그리스 세계는 왜 나를 이렇게 강렬하게 잡아끄는 것일까 왜 그리스일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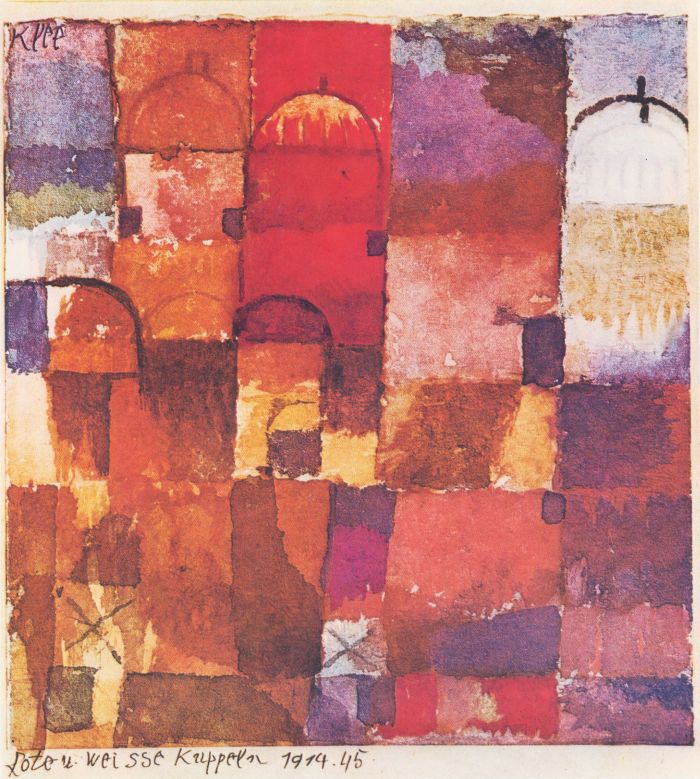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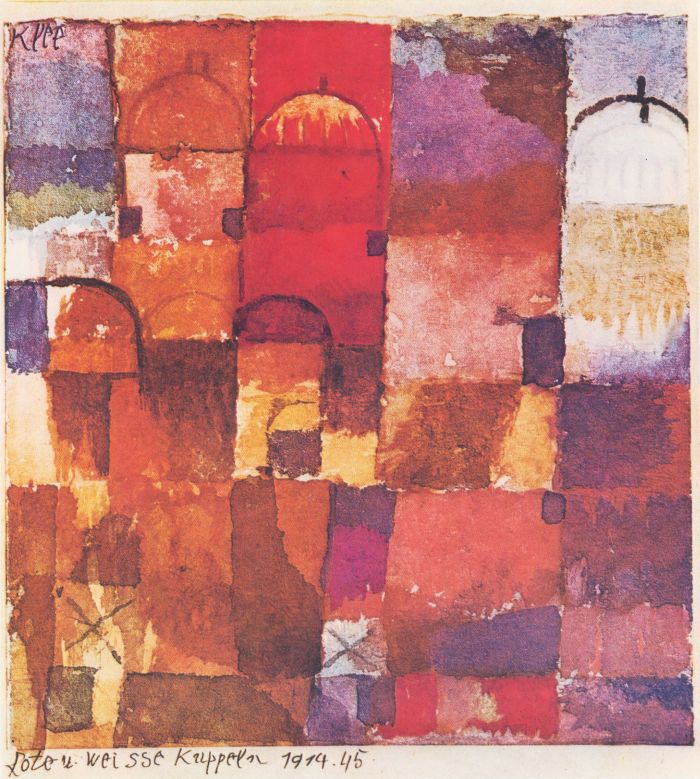
몇 개월간 이런 저런 경로로 계속 그리스와 만나면서 이런 경험후에 만날 진짜 그리스 땅, 그리스 땅만이 아니라 지중해 지방과의
만남은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게 되네요. 상상하는 과정과 실제로 만났을 때의 느낌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불일치
의외성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옛 그리스가 안고 있던 여러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내 인생은 내가 정하고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 내 삶의 결정을 나보다 상위 개념의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떠안고 가는
그런 저력에 끌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원정보가 없습니다
회원정보가 없습니다